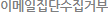천강에 비친 달 〈42〉
세종의 찬불가
수양에게 ‘광화문 괴자(愧字)사건’을 보고받은 세종은 즉시 의금부 판사를 불러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명했다. 의금부에서는 정 2품의 지사(知事)가 종 4품의 경력(經歷)을 대동하고 나와 화살과 괴자가 쓰인 종이를 수거해 갔다. 수사 대상은 의금부의 수사관들이 논의 끝에 결정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 불교를 혁파하자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유신들을 먼저 수사대상으로 올렸다. 같은 필체를 찾아내기 위해 그들의 집을 낱낱이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가에 수사의 칼바람이 회오리친 지 이틀 만이었다. 세종이 무슨 영문에선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을 내렸다. 가장 반발한 사람은 당연히 수양이었다. 아버지를 겁박하고 자신을 조롱한 자들을 잡아들여 직접 친국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수양은 신하들이 퇴궐한 뒤 내전에 들었다. 세종에게 읍소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내전은 세종의 남다른 총애를 받아온 후궁 신빈김씨가 어느 새 주인이 되어 있었다. 신빈김씨는 어린 수양을 업어 키운 적이 있어 양모나 다름없었다. 수양은 내전 큰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상궁이 귀띔을 해주었다.
“대군마마, 안에는 상감마마와 대사님이 계시옵니다.”
“알았네.”
방 안에서 병색이 완연한 세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대사가 한 말을 곰곰이 곱씹다보니 화가 누그러졌소.”
“전하, 신의 무슨 말에 화가 누그러졌는지 알고 싶사옵니다.”
세종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원망은 원망을 낳는다.”
“전하, 그것은 신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옵니다.”
신미는 예전처럼 자신을 낮추어 빈도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앞에 신(臣)자를 붙였다. 비록 임시관청이지만 언문청 학사이니 신하가 된 것이었다.
“수양의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으나 대사의 ‘원망이 원망을 낳는다’는 말에 놀랍게도 화의 불길이 꺼지는 것 같았소.”
“설령 괴자 사건의 주범을 잡아 율(律)에 따라 죄를 준다 해도 또 다른 괴자 사건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어느 시대나 반대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옵니다.”
“대사의 말이 맞소. 백성들은 엄한 율로 다스림을 받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더 바라는 것 같소.”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집현전 학사들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이옵니다. 또한 전하께서 숭불(崇佛)하신다고 상소를 올리는 신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옵니다. 괴자 사건을 일으킨 것은 분명 죄가 크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 없으니 이만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싶사옵니다.”
“화엄의 바다에는 맑은 물, 탁한 물이 섞여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화엄의 바다가 넓고 깊다고 했지요?”
“허공과 같은 마음이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고, 넓어지면 허공과 같다고 했사옵니다. 부디 허공과 같은 마음을 잃지 마시옵소서.”
“과인은 대사를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소. 도교는 신선이 되라 하니 공허하고, 유교란 사람 간의 약속으로 옥죄니 답답하고, 불교란 집착하지 말고 걸림 없이 살라하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소.”
수양이 내전 마당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자 상궁이 나직이 말했다.
“대군마마, 어서 드시지요.”
“아닐세. 그냥 돌아가야겠네. 오늘은 아바마마께 드릴 말씀이 없네.”
“이미 상감마마께 대군마마가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사옵니다.”
상궁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종의 목소리가 났다. 세종과 신미의 스스럼없는 담소가 끝났는지 세종이 내시에게 말하고 있었다.
“수양을 들라 하라.”
방으로 들어서는 수양의 얼굴은 조금 전과 달랐다. 얼굴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없었다. 세종과 신미가 나누는 담소를 귀에 담은 덕분이었다. 어느 새 분노 대신 대군으로서의 위엄과 패기가 흘렀다. 두 눈은 부리부리했고 콧날은 날카로웠다. 세종은 병색이 짙어지고 있었지만 수양은 건강미가 넘쳐났다. 그러나 세종이 수양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패기나 건강미가 아니었다. 수양이 지닌 각별한 불심이었다.

세종대왕 어진.
“수양은 누구보다도 불심이 깊소. 대사 그렇지 않소?”
“수양대군마마는 불심도 돈독하고 효심도 깊사옵니다. 대군마마께서 펴낸 <석보상절>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가계와 일대기를 서술한 〈석보상절〉은 수양의 순수한 창작은 아니었다. 양나라 때 승려 승우(僧祐)의 〈석가보(釋迦譜)〉와 당나라 때 승려 도선(道宣)의 〈석가씨보(釋迦氏譜)〉를 편역한 책이었다. 신미가 수양의 효심을 찬탄한 것은 수양이 어머니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보상절〉을 펴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끄럽습니다. 〈석보상절〉의 글은 대부분 김수온이 쓴 것이옵니다. 다만 저는 대자암에서 들었던 대사님의 팔상도(八相圖) 법문을 잊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서술하자고 하였을 뿐입니다.”
정작 신미 자신은 수양이 대자암에서 들었다는 팔상도 법문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양은 신미의 팔상도 법문이 자신의 불심을 뿌리내리게 했으므로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 이 〈석보상절〉도 우리 대사가 수양에게 인연의 씨앗을 심어주었구려. 우리 대사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겠소.”
“부처님은 무엇을 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사옵니다. 그러니 신은 전하와 대군마마를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사옵니다.”
“그렇다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기여한 대사의 공이 어디로 사라지겠소.”
“신은 이미 이름도 지우고 공도 내려놓았사옵니다. 전하의 공덕을 세세생생 높이는데 허물이 되고 싶지 않사옵니다.”
“수양은 어머니 명복을 빌기 위해 용문사에 보낼 불상을 조성하고 있소. 과인도 중궁을 위해 대사가 주석할 절에 불상을 조성하여 시주하고 싶소,”
“전하, 중궁마마를 위한다면 가까운 경기도에 절이 많사옵니다. 신이 돌아갈 절은 너무 먼 심심산골에 있사옵니다.”
수양이 세종의 말을 거들었다.
“대사님, 아바마마의 청을 들어주시오. 대사님이 출가했던 절이 복천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사옵니다. 출가했던 절도 복천사이고 돌아가 입적할 절도 복천사이옵니다.”
“아바마마, 대사님이 주석하실 복천사에 삼존불을 조성하여 시주하시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수양의 말이 옳다.”
신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다만 세종에게 청을 하나 했다.
“전하, 신은 소원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말해 보시오.”
“전하께서 〈석보상절〉을 참고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훈민정음으로 지으시면 어떠하겠사옵니까?”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듯 석가모니부처의 교화가 온 백성에게 드리우는 노래이니 글자 그대로 〈월인천강지곡〉이 되겠구려.”
“수승하시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두루 미친다는 노래이니 아마도 전하께서 지으신 〈월인천강지곡〉을 보거나 듣게 되는 백성들마다 불교에 귀의하는 마음이 솟구칠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찬불가로 길이길이 기릴 것이옵니다.”
신미는 밤이 깊어 내전의 큰방을 나왔다. 그때 신빈김씨가 다가와 신미에게 보자기 하나를 건넸다. 내불당을 자주 찾는 신빈김씨는 신미를 극진히 예우했다. 한 궁녀에게는 보자기를 들게 하고, 또 한 궁녀에게는 내불당까지 청사초롱을 밝히도록 당부했다. 신미는 내불당으로 돌아와 보자기를 폈다. 보자기 속의 대나무상자에 든 것은 왕실에서 야참으로 만들어먹는 두꺼비처럼 복스럽게 생긴 두텁떡이었다. 신미는 희우를 불러 내불당 승려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세종은 신미와의 약속을 지켰다. 신미와 김수온의 도움을 받아 580여 장(章)의 <월인천강지곡>을 몇 달 만에 지었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부처를 협시하는 금동아미타삼존불을 조성하여 복천사에 시주하였다. 소헌왕후를 추복하는 뜻도 있었지만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신미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었다. 세종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 속리산 복천사에 금동아미타삼존불을 조성하여 시주하는 뜻을 아는 신하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수양과 안평, 정의공주, 김수온, 정효강 등만이 세종의 마음을 알 뿐이었다.
또한 세종은 〈월인천강지곡〉을 짓기 시작한 데 이어 이 년 뒤 내불당을 궐 밖의 인왕산 산자락에 안평대군을 총감독 삼아 큰 건물로 지어 초겨울에 낙성식을 한 바, 그날 사용할 7 곡 9장의 찬불가를 손수 짓고 작곡했다. 이 찬불가는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이른바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 장면이 나오는 〈화엄경〉에 의거한즉, 세종이 〈화엄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일이었다.
세종이 작곡한 7곡 9장은 낙성식 하는 날 단순히 신도들의 찬불가로만 불린 것만은 아니었다. 불상을 봉안하고 사리를 안치하는 동안의 봉불공연(奉佛公演)에서 궁중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바라춤과 조화를 이루었다. 악기가 29종, 악공(樂工)이 45명, 그리고 죽간(竹竿)을 든 사람이 2명, 노래하는 사람(歌者)이 10명, 꽃을 들고 춤추는 무동(執花舞童)이 19명으로 총 76명이 움직였던 것이다. 통솔자는 박연(朴堧) 등 5명이었고, 세종의 명을 받아 내불당으로 악보를 받들고 간 사람은 수양이었다. 세종 31년(1449) 12월 6일의 일이었다.
세종이 불단에 임금이 입는 곤룡포 2벌과 침향 1봉을 올렸던 것도, 신미와 김수온이 삼불예참문(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을 지어 바쳤던 것도 바로 그날이었다. 세종이 불단에 친히 곤룡포를 올리는 모습은 내불당 마당에 도열한 261명의 신하들을 놀라게 했다. 신하들은 잠시 웅성거렸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유신들이 경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임금이 공개적으로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세종이 지은 7곡 9장 중에서 9장 1절의 찬불가 가사는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삼보님
수승한 공덕 끝이 없어라
크나큰 평온과 대자대비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시네
나 이제 마음 바쳐 귀의하오니
전도된 업장 소멸케 하소서.
낙성식이 끝나갈 무렵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삼존불의 불상이 등롱의 불빛처럼 환하게 방광(放光)을 했다. 영롱한 사리 2과도 출현했다. 대군들과 신미는 세종의 신심에 부처가 응답한 이적이라고 믿었다. 한때 마음속으로 세종을 비방했던 몇몇 신하들이 참회하기도 했다. 감동을 크게 받은 세종은 이때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김수온에게 명했다. 김수온은 심혈을 기울여 세종에게 지어 바치니 그 책이 바로 <사리영응기>였다.
낙성식 전후로 성안 백성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백성들은 세종이 작곡한 거룩한 찬불가를 부르면서, 장엄한 봉불공연을 보면서, 신미의 법문을 들으면서 극락정토에 와 있는 듯 모두가 환희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