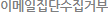금강산 붉은 승려〈11〉
금강산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다. 태허는 월초의 당부대로 1923년 4월 8일에 소요산 자재암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법명은 성암(星巖)에서 성숙(星淑)으로 바뀌었다. 성숙은 속가에서 썼던 본명이기도 했다. 출가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처지였으므로 상관없었다. 태허는 비구계 수계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차응준, 김규하와 함께 홍천 수타사 가는 길로 나섰다.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들판에는 보리가 파랗게 봄바람에 물결치고 있었다. 논두렁길도 어느 새 쑥, 냉이, 씀바귀, 봄까치꽃 등의 봄풀이 뒤덮고 있었다. 나물을 캐는 처녀들이 이따금 보였다. 겨우내 얼었던 논흙을 뒤엎고 있는 쟁기질하는 농부도 보였다. 쟁기를 끄는 암소가 코를 씩씩거렸다. 세 사람은 가평에서 농부들 사이에 끼어 새참을 얻어먹기도 하고 점심때는 탁발을 하여 공양을 해결했다. 새참을 얻어먹을 때는 차응준이 대금으로 <태평가>를 불어 축원하듯 답례했고, 낯선 마을에 들어 탁발할 때는 김규하와 태허가 목탁을 구성지게 치면서 주인을 불렀다.
수타사에서 하룻밤 묵기로 한 것은 태허가 결정했다. 운허가 서울에서 일경(日警)에 쫓기어 처음으로 숨은 곳이 수타사였다고 하는데, 태허는 운허를 숨겨준 수타사 주지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진달래꽃은 홍천 가는 길의 산자락에도 만발해 있었다. 세 사람은 지름길을 타기 위해 가평땅 끝자락에서 나룻배를 타기도 했다. 오르막 산길로 들어서서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김규하가 처졌다. 태허와 차응준은 앞서 산길을 오르다가도 김규하가 보이지 않으면 한참을 기다리곤 했다.
산마루에 자리 잡아 앉은 차응준은 김규하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한 듯 바랑을 풀었다. 바랑에서는 뜻밖에도 붉은 치마가 나왔다. 대금은 노을빛깔로 빛이 바랜 치마 속에 있었다. 태허가 차응준을 마주보고 앉아서 물었다.
“속가아내 치마인가요?”
“도둑장가 든 적도 없고 더더구나 처자하고 입 맞추어 본 적도 없는디 어디에 속가아내가 있겠십니꺼.”
“그럼, 누구 치마란 말이오.”
“할매한테 전해 받았는디 속가 어메 시집 올 때 입은 치마라고 합니더. 난 우리 어메를 보지 못했십니더. 날 낳고 돌아가셨다고 합디더.”
차응준의 등 뒤로 키들이 큰 진달래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봄볕을 받고 있는 꽃무더기가 화사했다. 차응준은 진달래 꽃그늘 아래 앉아 땀을 들이면서 대금을 만지작거렸다. 꽃그늘이 차응준의 얼굴에 어른거리다 사라졌다.
“어머니 치마요?”
“불쌍한 어메 혼을 저라도 달래주고 싶어서 바랑에 넣고 다니지예. 이 대금은 어메가 품은 한스런 소리를 냅니더.”
“스님은 속가 아버지 손에 자랐구먼요.”
“아부지가 어메 제사라도 지내주었으면 어메 혼이 덜 외로웠을 낍니더. 속가 아부지는 우리 어메가 죽자 바로 집을 나가 다른 아지매하고 살다가 술병이 나 죽었다고 합니더.”
“응준스님한테 쓸데없는 말을 물어본 것 같소.”
“지가 태허시님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십니더.”
차응준이 대금의 천공에 입술을 대고 음을 조율했다. 천공에 축축한 입 바람을 넣어야만 소리내기가 용이해지는 모양이었다.
“대금을 분 지는 얼마나 됐소?”
“열다섯 살 때부터 남사당패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십니더. 그러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십니더.”
차응준은 남사당패 인기가 시들하면서 각자도생하자고 해산한 뒤 절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남사당패를 따라 전국의 장터를 돌아다녀서인지 말할 때 경상도 사람인데도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이윽고 차응준이 대금을 불었다. 몰입하면 대금의 소리와 차응준의 몸이 함께 움직였다. 감았던 눈의 눈꺼풀이 떨고 어깨가 움직이고 몸이 뒤뚱거렸다. 대금이 흐느끼는 소리를 내면 차응준의 몸도 같이 흐느끼는 듯했다.
김규하가 나타나자 차응준이 대금을 입에서 내렸다. 김규하는 몹시 힘이 드는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타사는 아직 멀었십니꺼?”
“저기 보이는 집들이 홍천 장터이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더.”
“발바닥에 물집이 잽혀 참말로 죽을 맛입니더.”
산길과 시골 길은 차응준이 훤했다. 전국의 장터를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시님, 수타사계곡에 용담(龍潭)이 있지예. 거기 물에 세족하면 몸뚱이가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더. 물집도 바늘로 따고 용담 물에 발 담그고 나면 씻은 듯이 나을 낍니더.”
김규하도 땀을 들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차응준이 또 대금을 불었다. 태허는 차응준이 대금을 부는 것도 그 나름의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비록 한스럽게 들리지만 그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대금 소리와 하나 되는 그의 몸은 무아(無我)의 황홀한 모습이었다. 선사들이 체험하는 무아의 상태가 바로 그것인 듯도 했다. 차응준은 한 곡을 더 분 다음 한 마디 했다.
“이 대금이 없었다면 천지간에 외로운 지는 술주정뱅이가 되어 미쳐버렸을지도 모르지예.”
수타사에서 하룻밤을 잔 세 사람은 양양으로 내려가 낙산사로 떠났다. 이번에는 태허의 몸이 가볍지 않았다. 수타사 객방에서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잔 탓에 감기가 들어 자꾸 기침이 터져 나왔다. 양양 가는 길에도 진달래꽃이 만발해 있었지만 태허는 몸이 불편한 탓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오를 지나서는 머리가 어질어질 했다. 한번 아프면 몹시 앓게 되는 체질이었으므로 태허는 은근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가 떨어진 뒤에야 낙산사에 도착한 세 사람은 저녁공양을 마치자마자 객방에 들었다. 차응준과 김규하는 곧 코를 골았지만 태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도소리가 바로 귀밑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몸에 한기가 들어 이부자리를 덮고 새우처럼 웅크리곤 했다. 두 사람이 잠을 깰까봐 기침도 함부로 못하고 삼켰다. 새벽에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목이 따끔거리고 입술이 타 밖으로 나가 석간수를 들이켰다. 찬 바닷바람을 쐬니 살 것 같긴 했지만 열을 삭이는 데는 그 순간뿐이었다. 태허가 바깥을 자주 들락거리자 차응준이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태허시님, 더 심하게 아픕니꺼?”
“밤새 한 숨도 자지 못했소. 그러나 제 걱정은 하지 마시오. 금강산까지 갈 힘은 남아 있소.”
“무리하지 마시지예. 낙산사에서 하루 이틀 더 있다 가도 될 낍니더. 속초 위 고성까지만 올라가면 금강산 1만 2천 봉 중에서 남쪽으로 금강산 끄트머리 봉인 구선봉이 보입니더.”
금강산 끄트머리 봉이 보인다는 말에 태허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차응준의 말은 사실이었다. 속초에서 고성까지 바닷길로 가다보면 구선봉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진 해금강이 보였다. 태허가 굳이 금강산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 운명이 어찌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사람들도 유람하고 싶어 했던 금강산을 눈에 담고 떠나야만 여한이 없을 듯싶었다. 태허는 금강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놀랄 정도로 힘이 났다. 그러나 밥맛이 없어 아침공양은 한 술도 뜨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
차응준이 말했다.
“태허시님, 몸둥이가 불편하면 건봉사를 가지 말고 바로 해금강 쪽으로 갑시더. 바닷가 길은 가파르지 않십니더.”
건봉사를 가려면 속초에서 바닷가 길을 따라가다가 동해를 등지고 내륙에 있는 고성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건봉사 산세도 금강산 끝자락에 있다고는 하지만 해금강, 만물상에 비교할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다. 태허는 원래대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건봉사에 들러 참배합시다.”
차응준이나 김규하는 반대를 못했다. 태허에게 봉선사에서 신세를 진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금강산을 가는데 태허가 길을 결정하는 향도(嚮導)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태허는 건봉사에서 고열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하더니 정신을 놓아버렸던 것이다.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김규하였다. 이상하게도 차응준은 침착했다. 차응준은 태허를 반드시 눕혀놓고 태허의 손과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방망이를 들고 태허의 발바닥을 세차게 쳤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태허가 벌떡 일어났다. 차응준이 태허를 업고 말했다.
“고성읍으로 나가면 한의원이 있을 낍니더.”
“이 밤중에 어디로 간단 말이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태허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기운은 없지만 분명한 말투로 말했다. 차응준은 태허가 깨어났다고 생각하고는 안심했다.
“아이고, 깜짝 놀랐십니더.”
방안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지만 바깥의 세계는 적막강산이었다. 별들이 산자락에 곧 떨어질 듯 가깝게 떠 반짝이고 있었다. 이따금 소쩍새가 적막을 휘젓듯이 울 뿐이었다. 김규하는 곧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 그러나 태허와 차응준은 엎치락뒤치락 했다.
“태허시님 잡니꺼?”
“아니오.”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십니더. 막혔던 혈을 다 뚫어놨으니 하루만 푹 쉬면 나을 낍니더.”
“지압을 배운 적이 있소?”
“남사당패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웠지예. 남사당패 중에 늙은이들은 웬만한 병을 다 치료해줍니더.”
태허는 자신도 모르게 차응준의 손을 잡았다. 차응준이 옆에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응준의 투박한 손은 따듯했다.
“응준스님, 잊지 않겠소.”
“태허시님이 아니라면 지가 어찌 중국으로 갈 수 있겠십니꺼. 그러니 지가 고마울 뿐이지예.”
차응준의 권유대로 태허는 건봉사에서 하루를 더 머무르다 다시 동해로 나가 해금강 쪽으로 향했다. 장안사나 마하연사도 가보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하여 먼발치에서 금강산 1만2천봉을 바라보며 바닷길로 가다가 유점사로 들어갔다.
차응준이 태허의 기분을 맞추어주었다.
“눈으로 금강산 상상봉인 비로봉을 쳐다봤으니 금강산을 다 본 것입니더. 하하하.”
유점사에는 중국으로 갈 승려가 또 있었다. 범어사에서 온 김봉완과 신계사에서 온 윤정묵, 전북 정읍에서 온 한봉신이 있었다. 태허는 며칠 동안 도반처럼 가까워진 차응준과 금강산 산자락으로 올라가 그의 대금소리로 기운을 되찾았다. 차응준이 부는 대금소리는 한스럽기 짝이 없는데도 신기하게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살맛이 났다. 대금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에 눕는 보리 같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면 힘없이 눕혀졌다가도 바람이 그치면 다시 파랗게 일어서는 보리를 연상시키는 소리였던 것이다.
이윽고 태허는 중국으로 떠나고 싶어 몸이 달은 다섯 명의 승려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다. 모두 다 북경으로 가서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 했다.
*본 원고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게재권은 미디어붓다에 있으므로, 본 원고를 허락없이 임의로 퍼나르거나 옮겨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으로, 불법행위이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