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부처님이 탄생한 땅이라면, 스리랑카는 그가 평생을 펼쳤던 가르침, 다르마를 기록한 수트라(Sutra), 즉 경전(經典)이 탄생한 땅이다.아마 패엽경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싶다.
만일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자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을 그저 과거 어느 때 살았던 위대한 선각자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작은 나라, 인도의 눈물로도 불리는 이 작은 섬이 우리 불교사에서 더 없이 소중하고 크게 다가오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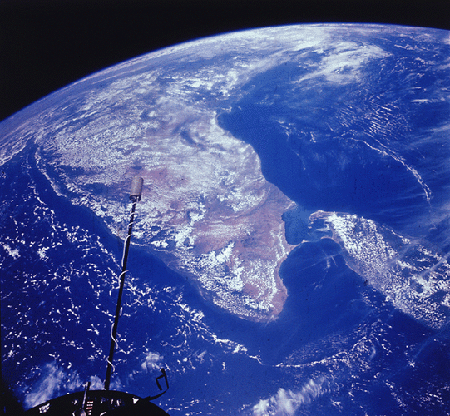
다르마의 땅, 스리랑카로 떠날 기회가 마침 다가왔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난 후 한 달쯤 뒤인, 지난 1월 나는 착잡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별 망설임 없이 스리랑카 행을 결정했다. 40대 후반에 졸지에 ‘백수’가 된 처지가 안 돼보였는지 나를 아껴주던 스님과 지인들이 고맙게도 순례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처음엔 그냥 심신을 편히 쉬겠다는 마음으로, 또 인도는 몇 차례 다녀왔지만 스리랑카는 처음인지라 어떤 호기심으로 따라 나선 여정이었다. 그저 일행의 뒤편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순례를 마치리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막상 출발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시나브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취재수첩과 펜, 그리고 조그만 디지털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메고 나니,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기자의 본성이 불현듯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 얼마 안 있으면 뭐든 다시 할 텐데, 일단 취재를 하자. 게다가 아직까지 스리랑카 불교유적 순례에 대한 내로라할만한 기행문도 나온 게 없지 않은가.” 내심 취재를 결정하고 그 결심을 공표하고 나니, 함께 한 일행들이 잘 생각했다며 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경전의 탄생성지 스리랑카 불적에 대한 나의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게다가 이제 인터넷 불교언론 ‘미디어붓다’까지 창간했으니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을 이유도 없어졌다. 함께 순례를 했던 도반들의 언제 순례기를 볼 수 있겠느냐는 보챔을 견딜 명분이 그만 사라진 것이다.아무려나. 지금부터 스리랑카 불교와 불교유적 순례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순례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미디어붓다의 가족(독자)들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