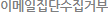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정복한 산 사나이, 엄홍길과 박영석. 그들은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짐을 꾸릴 것이다. 프놈 복을 오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떠올린다. 비교의 함량은 어림없지만 쏟아지는 땀방울에 보답하려면 그들의 이름이라도 끌어들여야했다.


앙코르 유적 중 산꼭대기에 세워진 세 개의 사원 중 마지막으로 프놈 복을 방문한다. 일몰을 감상할 심산으로 오후 네 시쯤 입구에 도착했다. 주차장 부근에서 산꼭대기까지 까마득하게 직선으로 뻗은 계단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천국에 오르는 계단인가, 걸어서 하늘까지 가라는 말인가. 산을 빙빙 돌아 오르는 오솔길이 있었을 터인데 다짜고짜 시멘트로 수직 계단을 만든 저의를 알 수 없다. 소나기를 맞은 듯 땀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연신 손수건을 짜보지만 터진 물꼬를 잡기 어렵다.
동행한 최 교수와 계단을 세면서 오르기로 했다. 더위와 피로를 잠시 밀쳐내겠다는 수작이다. 100개씩 오르고 10분 간 휴식을 했다. 수첩에 적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져 계단 100를 오르면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 쥐었다. 원시로 돌아가는 흐뭇함도 더불어 즐긴다. 계단을 오르는데 30여분 걸렸지만 하루 종일 사막의 뙤약볕 속을 헤맨 느낌이다. 계단을 센 수치가 서로 틀린다. 나는 635개, 최 교수는 638개란다. 헛수고를 한 건가. 하산하면서 다시 세어보는 수밖에. 마지막 계단을 밟고 뒤를 돌아보니 만주 벌판 같은 대평원이 펼쳐져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해발 238미터에 불과한데 중천에 떠있는 느낌이다. 지평선 너머에 남지나해가 보이는 것 같다.
계단이 끝난 지점에 현대식 사원이 있다. 아랫마을 청년들과 젊은 스님이 물탱크 옆에서 등목을 하고 있다. 목례를 꾸벅하고는 다짜고짜 셔츠를 벗어던지고 등목에 합석했다. 산꼭대기에서 덮어쓰는 물줄기가 고맙기 그지없다. 이곳 역시 방문객이 뜸한 사원이라 사람대접이 더욱 살갑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니 무너진 석벽 안에 역시 무너진 세 개의 탑이 천 년 세월을 지키고 있다. 한 줄로 늘어선 세 개의 탑, 똔레삽 호수 입구에 있는 프놈 끄롬과 비슷한 구조다. 10세기 초 야소바르만 왕 때, 같은 장인의 솜씨인가 보다.




이곳의 경이로움은 꽃이 만발한 럼 쩜빠이 나무다. 백목련처럼 생겼으되 꽃송이가 그보다 작다. 흰꽃 만발한 럼 쩜빠이 나무가 사원 입구 코푸라 위에서 자라고 있다. 건물을 휘감고 비틀어 무너뜨리는 나무만 보다가 눈부신 화관이 되어 돌문 위에 앉은 모습이 자랑스럽다. 처음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인공과 자연의 조화가 이 정도면 극치가 아니랴.
폐허를 예견하여 우아한 화관을 준비한 황제를 위하여 축배라도 들고 싶다. 그러나 배낭에는 반쯤 남은 생수병이 고작이다. 그것이라도 벌컥 마시며 꽃다발을 향해 건배를 제안한다. 때마침 바람이 쏴아 불어 꽃잎이 떨어진다. 낙환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 하리오. 열대 식물은 대체로 향이 없다. 우아한 자태를 가진 서양란에 코를 댔다가 반응 없음을 느낄 때, 그 배신감은 참혹하다.
럼 짬빠이는 매운 향을 사방에 흩뿌린다. 배신하지 않는 꽃의 절개가 송구스러워 눈치 볼 타인이 없는 산정에서 마음껏 소리를 지른다. 고국에 두고 온 분노와 절망, 사랑과 미움을 털어버리려고 악을 쓴다. 이 화관을 위해 천년을 참아온 석탑이 빙그레 웃는다. 어느새 일몰이 화염의 포탄을 장전하여 서서히 발사할 태세다.


천년 고탑 사이로 태양을 끼워 넣고 셔터를 누른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그럴듯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관리인 청년이 곁에 붙어 서서 하산할 것을 독촉한다. 앙코르의 퇴장 시간은 여섯 시다. 야간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둠은 도심(盜心)을 유발하는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가 눈치를 채고 청년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애쓴다. 녀석의 손에 고무줄 새총이 들려 있다. 표적을 만들어 새총 쏘기 놀이를 시작한다. 녀석의 솜씨는 위력적이다. 뻔히 알면서 내기를 시작한 것이다. 녀석은 10미터 거리에 병뚜껑만한 납작돌을 세워 놓고 명중시킨다. 최 교수는 연신 빗나간다. 허구한 날 무료함을 달래려고 새총 놀이를 한 솜씨니 녀석을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간 끌기가 목적인 게임, 져주기로 작정한 게임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은 관리인의 본분을 잊고 박수갈채에 몸이 붕 떠 있다. 어쨌든 대단한 솜씨다. 일몰이 절정의 얼굴을 보여주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어둑어둑한 하산길에 녀석도 함께 동행 한다. 퇴근길인 모양이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비상하기에 딱 좋은 지세다. 난간을 잡고 조심스레 내려왔다. 계단의 숫자를 세는 것을 깜박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헛수고였다. 녀석에게 물으니 정답을 알려준다. 632개 계단. 시멘트 포대를 져 나르며 공사를 함께 했다고. 이 계단을 오르내린지 3년이나 됐다고 자신만만하게 대꾸한다.
앙코르 산정 사원 세 곳을 모두 오르다. 꼴답잖게 어깨를 으쓱해본다. 어둠이 그 주책맞음을 숨겨준다.
*프놈 복은?
9세기 말-10세기 초 야소바르만 1세 때 건립되었다. 프놈 바켕, 프놈 끄롬, 프놈 북 등 3개의 산정 사원은 모두 야소바르만 1세 때 건립되었다. 왕의 개인적 취향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해발 235미터, 근래에 만든 632개의 시멘트 계단이 평지에서 산정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