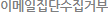보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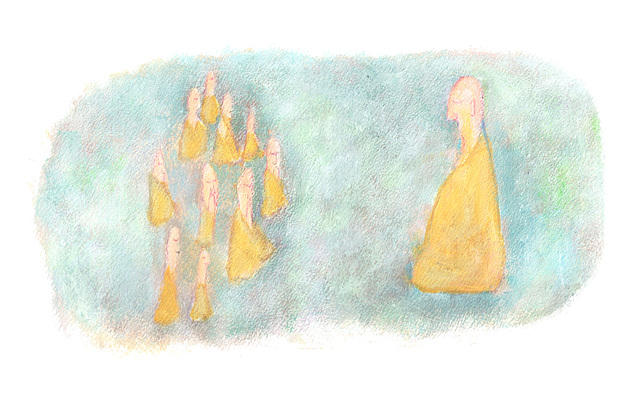
(삽화 정윤경)
칠엽굴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라자가하 허공에 뜬 아침 해가 칠엽굴 맞은편까지 떠올라 있었다. 굴 안이 밝아지자 5백 명의 장로들은 각자 자리를 좀 더 넓게 하여 앉았다. 동굴 안쪽이 캄캄하여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다리가 저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햇빛이 동굴 안까지 비추었으므로 조금 전보다 각자의 자리가 넉넉해졌다.
오늘은 탁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마가다국 빔비사라왕이 하인들을 시키어 칠엽굴까지 공양을 올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빔비사라왕은 훗날 붓다의 상수제자들이 아난다에게 오늘 들었던 <금강경>을 기원정사에서 자신에게 들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기대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5백 명 장로들의 공양을 준비해 올렸던 것이다. 5백여 점의 돌발우는 빔비사라왕이 석공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고, 음식은 궁중요리사들이 밤새 요리한 짜파티와 커리였다.
공양을 마친 5백 명의 장로들은 다시 아난다의 암송을 듣기 위해 허리를 곧추세우고 가부좌로 앉은 채 시선은 아난다에게 고정시켰다. 아난다는 동굴 안쪽에 있는 자기 자리로 가서 흘러내린 가사를 어깨 위로 올렸다. 그런 뒤 공양하기 전까지 암송했던 붓다의 말을 상기했다.
붓다는 여전히 보살의 길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었다. 아난다는 붓다가 수부띠 장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처럼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아난다의 짐작은 옳았다. 붓다는 ‘부처의 눈(佛眼)’으로 영원히 평안한 피안으로 가려고 하는 수부띠의 열망을 잘 보고 있었다. 수부띠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나는 중생들에게 내가 깨달은 다르마(法)를 보시했으니 공덕이 클 것이다.’
‘나는 그 공덕으로 영원히 평안한 피안으로 갈 것이다.’
‘이제 나는 그토록 열망했던 보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아난다도 수부띠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수부띠는 그에게 무쟁삼매(無諍三昧)가 무엇인지 자애로운 태도로 알려주었던 것이다.
무쟁삼매란 공(空)을 확철하게 깨달은 상태에 있으므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과 다툼(諍)이 없는(無) 삼매(三昧)를 일컬었다. 무쟁삼매에 들면 항상 중생과 함께 있으되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깊은 연민 속에서 머물렀다. 연민이 일면 보살행은 저절로 행해졌다. 무쟁(無諍)이란 말로 하는 언쟁(言爭)이고, 쟁심(諍心)이란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어 말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므로, 무쟁삼매를 닦으면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므로 번뇌가 일어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부띠는 아난다에게 자애삼매에 어떻게 드는지를 보여주었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다원의 흐름에 든 모든 벗들에게 그러한 다르마를 보시했으므로 아난다는 수부띠 장로가 반드시 보살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수부띠여, 구도자인 보살은 물건에 집착해 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엔가 집착해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형태에 집착하고 보시해서는 안 된다.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느낌이나, 생각의 대상에 집착해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부띠여, 만약에 구도자인 보살이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은 거듭거듭 쌓여서, 쉽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 허공의 양을 쉽게 헤아릴 수 있을까?”
수부띠는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스승은 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도, 서도, 북도, 아래도, 위도, 이와 같이 시방(十方) 허공의 양도 헤아릴 수 있을까?”
수부띠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수부띠여, 이와 마찬가지다. 만약에 구도자인 보살이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쌓인 공덕은 쉽게 헤아릴 수 없느니라. 실로 수부띠여, 보살의 길을 향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생각을 남기지 않고 보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붓다는 수부띠가 보살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면서도 그에게 중요한 한 마디, 즉 ‘보살은 보시할 때 보시했다는 마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켜 주었다. 아난다는 나름대로 짐작했다.
‘무엇을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스승님의 말씀이 아닐 것인가. 스승님은 ‘무엇을 보시했다는 마음이 사라진 보시’를 수부띠 장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어려운 일이다. 벗에게 아끼는 가사를 주었는데 어떻게 보시했다는 마음을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가사를 받은 벗이 마음에 들까. 얼마나 좋아할까 등등 저절로 헤아려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직 수부띠의 경지까지 가려면 멀었다. 수부띠 장로는 붓다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붓다가 수부띠를 통해 말씀하시는 까닭은 나는 물론이고 모든 벗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리라.’
1,250명의 비구들은 방금 공양을 한 까닭에 붓다의 설법 중에 ‘형태에 집착하고 보시해서는 안 된다.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느낌이나, 생각의 대상에 집착해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더 실감 났다. 마침 아난다는 언제가 붓다에게 들었던 설법 한 구절이 떠올랐다.
붓다가 까장갈라의 무겔루와나에 머물 때였다. 빠라싸리아의 제자인 청년 바라문 웃따라가 붓다를 찾아왔다. 그때 붓다가 청년 바라문 웃따라에게 물었다.
“웃따라여, 빠라싸리아 바라문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바라볼 때 어느 경지까지 가는 수행을 하는가?”
“고따마 붓다시여, 눈으로 보되 대상을 보지 않아야 되고, 귀로 듣되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붓다는 빠라싸리아 바라문이 젊은 바라문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눈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좋다, 싫다[好惡]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감정으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애초에 보이는 것을 차단한다는 수행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붓다는 보이는 것을 차단하기보다는 대상을 받아들이되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이므로 대상을 통해서 공(空)을 절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붓다가 젊은 바라문 웃따라에게 말했다.
“웃따라여, 빠라싸리야 바라문의 수행은 옳지 않소. 그 수행이 가능하다면 장님은 앞을 볼 수 없으니 눈으로 보지 않는 수행이 이미 끝난 사람이나 다름없고, 귀머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귀로 듣지 않는 수행이 이미 끝난 사람이나 다름없소. 웃따라여, 빠라싸리야 바라문 수행의 경지처럼 장님은 눈으로 대상을 보지 않고, 귀머거리는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다오.”
붓다의 말에 웃따라 바라문은 더 이상 말을 못 한 채 우물쭈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붓다가 그때 옆에서 시봉하고 있는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빠라싸리야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수행과 달리 나는 위없는 수행을 너에게 말하리라.”
“스승이시여,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물론이고 벗들이 명심할 것입니다.”
“아난다여, 대상을 받아들일 때 위없는 수행은 무엇일까? 비구들이 모양을 볼 때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느낌에서 오는 분별은 수행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 느낌을 없애버려야 평정심이 될 수 있느니라. 아난다여, 대상을 눈으로 볼 때만이 아니라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맛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혀로 맛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촉각으로 촉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수부띠 역시 아난다의 암송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이 백 번 천 번 옳다고 받아들였다. 대상을 받아들일 때, 호오의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을 잘 통찰하여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모습에 대한 관념이나 선입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 수행을 하면 굳이 옳으니 틀리니 하고 잠시 만들어진 관념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었다. 관념은 만들어진 것이니 곧 사라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부띠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지금까지 8정도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제는 함이 없는 보시바라밀을 수행해서 보살의 길로 들어서리라.’
수부띠가 보시바라밀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실제로는 6바라밀이었다. 관념이나 선입견에 머물지 않고 6바라밀을 행해야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보살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살이란 관념에 사로잡혀 논쟁을 즐기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6바라밀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대자유인인 것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