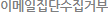다음날 이구를 향한 전향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구는 대머리 중좌와 다시 마주 앉았다.
“만약 휴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이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남쪽으로 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고, 북쪽에 남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옥아의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중좌는 초조했다. 이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하면 북쪽에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인지 중좌는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 담배도 주고, 차도 내왔다. 목욕도 하게 하였다. 몸을 씻고 나오니 중국산 작업복 내의, 운동화, 모자, 담배, 그리고 국제적십자사가 보낸 선물 보따리까지 주었다. 그러나 이구는 망설였다.
“동무가 정 그렇게 망설인다면, 강옥아 동무는 어떻게 되겠소?”
중좌가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요. 더구나 강옥아 동무는 사상교육 시간에 자본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자본주의 교육이오?”
“흐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강옥아 동무를 끌어안았소?”
이구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옥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옥아 동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중좌가 웃었다.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소. 내일 아침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소.”
“고맙소.”
삽화 염정우
다음날 아침 중좌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옥아는 웃지 않았다.
이구는 옥아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저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북쪽은 안돼요.”
“그럼, 북간도?” 이구가 아득하게 물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 옥아는 이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북간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 끝난 것이다. 지난 세월이 쏜살처럼 스쳐갔다. 옥아는 이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웃었다. 이구의 순진한 발상이 우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엔 힘이 없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동그라미 속으로 사라진 먼 이야기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바보들의 놀음이었다. 그러나 이구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녀는 북쪽의 실체를 모두 보았다. 일제만도 못한 사내들이 조국과 민족을 들먹이며 강산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옥아는 뜬금없이 말했다.
“서울에서 만나지요.”
그러나 이구는 고개를 흔들었다.
“마찬가지요.”
이구는 확신하고 있었다. 증오와 증오로 서로를 겨눈 총칼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을 상처의 깊이를 알고 있었다. 서울과 평양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오늘 저녁, 당신과 북간도로 갈 거요.”
옥아는 웃지 못했다. 이구의 말은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옥아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차피 겨울이면 한 마리의 나비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만하면 화려하지는 못했어도 따뜻한 햇볕 한 철 두 개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수는 있었다. 비록 때아닌 눈보라와 폭풍우를 맞았지만. 슬프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다. 옥아는 눈을 감았다. 명장사의 단아한 한문 족자 한 폭과 한글 족자 한 폭이 마주 보며 웃고 있었다.
今生 未明心
滴水 也難消
이 강산 어디에
나를 묻을꼬
회산이 먹을 갈고 있었다. 회산의 먹 가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옥아가 이구의 손을 잡았다. 옥아는 울고 있었다.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안 보는 척하면서 경비병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상관없었다.
“내일 저녁, 당신과 북간도로 갈 거요.”
이구가 뜬구름처럼 매달렸다.
마침내 옥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이구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여기 남겠소.”
“동무!” 중좌가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올리더니 덥석 이구를 안았다.
“축하하오. 이제 동무는 우리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품안으로......”
한꺼번에 몰려든 다른 경비병들도 박수를 쳤다.
“정이구 동무, 참으로 의로운 선택을 하셨소!”
그러나 옥아와 이구는 그날 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옥아의 학습시간이 끝난 새벽 2시 반이었다. 그들은 수용소 정문 바로 옆 철조망에 바짝 붙어 있었다. 이구는 철사를 끊는 작은 쇠톱을 손에 쥐고 있었다. 수용소 정문의 높은 망루에서는 수시로 회전 불빛이 철조망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3.8선까지 도망간 포로들도 있어요.”
“모두 붙잡혔지요.”
옥아는 웃었다. 어제까지 뜬구름을 좇던 이구가 갑자기 현실적이 된 것이다. 두더지처럼 철조망 아래에 누운 그들은 가까스로 철조망의 가장 아랫단을 끊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용소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수용소 바깥에는 쉴 새 없이 트럭들이 다니고 있었다.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포로들을 실은 트럭이었다. 수용소 바깥에는 작은 수로들이 파져 있었다. 탈출을 막자는 의도였다. 그들은 죽은 물풀들이 아우성을 치는 개울가 옆에 드러누웠다. 운 없게도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아버님은 살아 계셔요. 무산 탄광에......”
“예?”
“정처사님이 남쪽으로 간 것을 알고 있지요.”
“......”
이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식당의 조리원 동무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많습니다. 내가 탈출을 해서 북간도로 가도, 아니면 붙잡혀서 죽어도, 그들은 모두 광산이나 탄광으로 갈 겁니다. 아니면 모두 죽겠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제 나라 제 오빠 제 아버지를 잘못 두어서 그 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에 맞춰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야지요.”
이구는 눈을 감았다.
“돌아갈까요?”
“아니요. 이제 가야지요. 북간도로.”
그렇게 바라던 말을 이구는 그제야 들었다. 예상대로 그들이 개울을 건너기 위해 몸을 들었을 때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경비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옥아와 이구는 태연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둘이 두만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그들이 개울을 건너 맞은편 언덕에 닿았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경비병들이 개울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 회산과 용구와 함께 사잇섬 강물에서 죽었어야 했다. 조금 늦은 것이다. 옥아가 정답게 물었다.
“꽃은 졌겠지요?”
옥아의 말뜻을 이구는 금방 알아차렸다.
“가을이면 패랭이꽃은 없어요.”
옥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산 스님이 우릴 반가이 맞아줄까요?”
“아닐 거예요. 바보 같다고 혼날 거여요. 공연히 세상일에 참견했다고.”
옥아는 문득 회산을 생각하면 떠오르던 난설헌의 시를 떠올렸다. 月樓秋盡玉屛空/霜打蘆洲下暮鴻/瑤瑟一彈心不見/藕花零落野塘中. 달빛 가득한 다락에는 가을이 한창인데, 고운 병풍은 쓸쓸히 비어 있네. 서리 내린 갈대밭엔 저녁 기러기 내려앉건만, 옥장식의 거문고로 한껏 흥을 돋우어도 들어 줄 임이 곁에 없으니, 버려진 연당에는 연꽃이 절로 떨어진다. 옥아는 명장사의 회산 등 뒤에 있던 고운 병풍을 생각했다. 그래, 이제 돌아가는 거다. 조금 있으면 동구 밖 틈으로 명장사가 보일 게고, 그곳에서 회산이 우릴 기다릴 것이다. 그곳에서. 그래, 이제 돌아가는 거다. 옥아는 눈을 감았다.
옥아, 그 거울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옥아는 아득히 회산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스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유일하게 엄마가 유품으로 남긴 그 거울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스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거울 속에는 언제나 스님 한 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흐흐.
“갈까요?”
“그래야지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일어섰다. 옥아와 이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무수한 총탄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한꺼번에 밭고랑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회산이 간 길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다. 경비병들이 급하게 개울을 건넜다.
삽화 염정우
하늘에는 달도 없었다.
별도 없었다.
그런데 누워 있었다.
수용소 밖 개울가 언덕 아래에 검은 그림자 둘이 누워 있었다. 이제 돌과 나무와 같이 무정물이 되어버린 가엾은 그림자 둘이 엎어져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이라곤 똥오줌 가리지 못했던 철없던 시절뿐이었던 생명 아닌 생명이 누워 있었다. 가랑잎처럼.
잎사귀가 모두 떨어진 바깥 도로변의 앙상한 오리나무숲에서는 귀신 울음소리가 들렸다. 밭 고랑 고랑을 구분해주는 둔덕에는 키만큼 자란 죽은 물풀들도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쏜살같이 내달리는 경비 트럭의 불빛, 그 불빛을 받아 순간적으로 일렁이는 개울가 물들, 활주로 부지를 만든다고 법석을 떨던 괭이와 삽들도 동작을 멈추고 있었다. 아직 땅은 얼지 않았지만, 밤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세찬 바람이었다. 낮게 깔린 구름, 언뜻언뜻 본래의 하늘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곧 눈이 내릴 기세였다.
두두두.
두두두.
요란한 군화 소리가 들렸다. 수용소로 가는 신작로 위에 급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렇지만 말은 없었다. 다만 먼 북간도를 넘어온 삽상한 바람이 그 발자국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아직까지 용케도 생존해 있는 밤새가 울었다. 군데군데 마치 눈 내린 것처럼 서리 덮인 얕은 개울가에서 밤새가 울고 있었다.
엉엉.
엉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