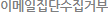시는 피를 맑게 한다
일러스트 정윤경
마중물 생각
스님은 휘파람을 잘 부셨다. 봄날 불일암 마당에서 휘파람을 불면 해우소 옆의 오동나무 구멍에 사는 철새 호반새가 나와서 공중제비를 했다. 녀석은 공짜로 사는 것이 미안했던지 스님의 휘파람 소리에 개인기를 보여주었다.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글로 밝히고 있다. 스님께서는 또 불일암에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면 반팔 속옷 차림으로 노래를 흥얼거리시며 장작을 쌓거나 밭을 매셨다. 그 노래가 잊히지 않는다. 바로 나의 은사님이신 서정주 선생님의 <푸르른 날>을 송창식 가수가 불렀던 것이다. 스님은 법문하실 때 필요한 책을 내려고 <말과 침묵>이란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각장 끝에는 꼭 애송하는 시를 한 수씩 소개했다. 오늘은 스님께서 봄날 두런두런 음미하셨던 시들을 모아 봤다. <한 몸이 오고 가는 것은>은 어느 날 스님께서 직접 붓글씨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나는 표구를 해서 가끔 감상하고 있다.
스님이 애송했던 봄날의 시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 미당 서정주
심산(深山)
심심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 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 청마 유치환
한 몸이 가고 오는 것은
흐르는 물은 산을 내려와도 연연하지 않고
흰 구름은 골짜기로 들어가도 그저 무심하다
한 몸이 가고 옴 물과 구름 같고
몸은 다시 오지만 눈에는 처음이네.
- 백운화상
산중인(山中人)
본래 산에 사람이라
산중 이야기를 즐겨 나눈다
5월 솔바람을 팔고 싶으나
그대들 값 모를까 그게 두렵네.
- 선종고련(禪宗古聯)
산에는 빛이 있고
바라보니 산에는 빛이 있고
귀 기울이면 소리 없이 흐르는 물
봄은 가도 꽃은 남고
사람이 와도 새는 놀라지 않더라.
- 야보선사
봄구경
지팡이 끌고 이슥한 길을 따라
홀로 배회하며 봄을 즐긴다
돌아올 때 꽃향기 옷깃에 스며
나비가 너울너울 사람을 따라온다.
-환성선사
두 선객에게
조계산은 선객들이 머물 만한 곳
늦봄 되면 산림이 눈부시어라
몇 가지 산다화는 불처럼 타오르고
천 그루 배꽃이 눈보다 희네.
-원감국사
갈무리 생각
스님께서는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렇다. 영혼의 피가 맑아지는 것을 누구라도 경험하지 않을까 싶다. 시를 감상할 때는 설명을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시를 읽는 이에게 무례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감상하면 그만인 것이다. 군더더기의 말 붙일 것 없이 스님께서 봉은사 다래헌 시절 32세 봄날에 지은 시를 소개하면서 갈무리 생각을 접는다.
봄밤에
내 안에서도
움이 트는 것일까
몸은 욕계(欲界)에 있는데
마음은 저 높이 무색계천(無色界天)
아득히 멀어져버린
강 건너 목소리들이
어쩌자고 또
들려오는 것일까
하늘에는
별들끼리
눈짓으로 마음하고
산도 가슴을 조이는가
얼음 풀린
개울물 소리
나도
이만한 거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한 천년 무심한
바위라도 되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