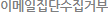연이를 위하여 31
(©장명확)
“오호!”
느린 물살을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 없는 연등은 잘도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물속에 불을 넣은 등을 띄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무엇을 빌었어요?”
할 말이 없다. 아무것도 빌지 않았으니까.
“전 빌었어요. 가엾게 죽은 언니의 왕생극락을.”
신기한 일이다. 외양은 몰라도 내면은 골수 공산주의자가. 내가 슬쩍 웃자, 그녀도 조금 쑥스러웠는지 한마디 덧붙인다.
“종교는 알음알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합장하고, 등을 밝히는 마음, 그것이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수없이 탑을 돌면서 절을 하는 그 마음, 그전에는 그걸 하도 봐서 우습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불쌍한 우리 언니 기일이에요.”
그제야 그녀가 흰 등을 띄운 이유를 알았다.
“그 등에 많은 걸 썼겠군?”
“깨알같이 썼어요……, 깨알같이.”
띄워 보낸 등이 가물가물 멀어지고 있었다.
“언니는 항상 이곳을 보고 있었어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저 물을.”
“오늘 좀 이상해.”
“맑은 날의 맑고 밝은 기분, 장마 진 날의 울적한 기분, 어린 싹이 나올 무렵의 싱그러운 기분, 봄비 내릴 무렵의 애잔한 기분, 여름날 아침의 상쾌한 기분, 폭풍우 치는 날의 무서운 기분…….”
종달새처럼 그녀는 재잘댔다. 마음이 공허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재잘거리게 된다.
“또 그 알 수 없는 소리.”
“인간이 이르는 곳에 청산이 있어.”
나는 감탄했다.
“인간이 이르는 곳에 청산이 있어?”
참으로 눈물 나는 언어였다. 그녀는 금방 젖은 눈을 들었다. 한껏 들떴던 마음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 것일까?
“인간이 머물지 않으면 청산은 없어?”
목이 멘 나는 학생으로서 그녀에게 다소곳하게 물었다. 그녀와는 반대로 입가에 미소를 달았다.
“그런데 정말 청산이 있을까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곧 알아들었다. 아득함, 헤어날 길 없는 아득함, 대상 없는 그리움, 청산!
나의 청산은 너로 하여 있다.
나의 청산은 너로 하여 있다.
나는 울었다. 다가갈 수 없는 아득함으로 하여. 밤은 깊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오그려 팔을 끼고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는, 등이 흘러간 물을 바라보고 나는 그녀의 젖은 얼굴을 보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윽고 그녀가 내 팔을 잡아끌었다. 그리고 산길로 들어섰다. 캄캄한 어둠, 발밑에 차이는 무성한 나뭇잎들. 멀리 불빛이 보였다. 풍경이 울었다. 대웅전을 제외한 세 개의 단출한 요사채, 불이 켜져 있는 방이 있었다.
“스님, 계셔요?”
순간 방문이 열렸다. 늙은 스님이었다. 방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스님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게 누군가?”
“누구긴요, 보경입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래에, 그래. 어서 들어와.”
그녀가 스님에게 큰절을 하였다. 물론 나도 얼결에 함께 절을 하였다. 스님도 우리와 맞절을 하였다.
“저쪽 처사는?”
“제 애인요.”
“뭐야? 흐흐흐! 보경인 여전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
“처음 뵙습니다. 김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안이라고 합니다.”
스님의 눈이 부리부리했다. 그런데 얼굴 양옆에 있는 예리한 흉터들.
“동봉도 여전하지?”
“늘 바쁘세요.”
“그 사람이야 항시 그렇지. 손톱만큼도 쉬는 법이 없어. 가만있어 뭐라도 내 와야지.”
“아닙니다. 스님. 밤도 늦었는데.”
“무슨 말을……, 까닭이 있겠지. 흐흐! 차 좀 내오라고 할께. 잠시만 기다려.”
스님이 나가자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다.
“동봉 스님과 도반이세요.”
“눈이 무섭군. 흉터도 그렇고.”
“마음은 비단결이세요. 젊을 땐, 만주에 계셨어요.”
“만주?”
“그곳 한인촌에 계셨어요.”
“독립운동을 했단 말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이곳으로 돌아오셨어요.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스님은 손수 한 아름의 과일 쟁반을 들고 왔다.
“노 보살님에게 차를 부탁했지. 나 때문에 시주가 들어오질 않아.”
“왜요?”
“누가 내 얼굴 보고 시주하겠어? 흐흐!”
“괜히 저희가…….”
“웬걸, 보경이가 왔다고 하니까, 지금 노 보살님 정신없어!”
“아직도 살아 계셔요?”
“물론이지. 꼭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흐흐흐!”
그리고 스님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다.
“그런데 어쩐 일이야? 놀러 온 것은 아닐 테고?”
스님이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여전히 부리부리한 눈.
“아니요, 놀러 왔어요.”
“흐흐흐!”
연이어 스님의 함박웃음이 터져 나왔다.
“진짜배기 빨치산이 남장사에 놀러를 오셨다아?”
그녀는 금방 토끼 눈이 된다.
“소승의 말이 틀렸는가요?”
“대사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맞장구를 친 그녀와, 한참 우리 둘을 보고 눈을 부라리던 스님이 한껏 웃었다. 그렇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백천사에 다녀오셨어요?”
그녀가 내 얼굴을 보더니 정색을 하고 스님에게 물었다.
“백천사에 간다고 동봉 스님께서 내게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럼?”
“흐흐, 부상당한 자네들 동지가 숱하게 지나갔네.”
“예?”
그제야 내가 눈을 번쩍 떴다.
“경찰에 잡혀간 사람도 몇 있고, 덕분에 나도 찍혔지. 백천사 동봉 스님이 상주서까지 직접 오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멀쩡하지, 그렇지 않았음 벌써 황천 갔지.”
“자주 오나요?”
“그전엔 매일이었지. 요새도 드문드문 와. 그들 말이 내가 약간 붉은색이래. 흐흐흐!”
“스님 얼굴은 전부 붉은색인데요.”
그녀가 또 눙을 치고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발랄한 모습.
“으, 그렇지 전부 붉은색이지. 흐흐흐!”
그때 밖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노 보살이 찻상을 들고 왔다.
“이게 누구야? 난 스님이 보경이가 왔다고 해서 긴가민가했는데. 정말이구먼!”
“할머니!”
“죽기 전에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저두 그랬어요.”
그녀와 노 보살은 서로 얼싸안았다. 노보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쩌누!”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살아 계신 걸 알았다면 들렀을 텐데.”
“괜찮여. 그래도 눈 안 붙이고 사니까 만나네. 어디, 얼굴 좀 보자!”
노보살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렇게 귀엽던 얼굴이…….”
“왜요오!”
그녀가 비로소 살짝 웃었다. 그러나 노보살이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굴에 건버짐이 앉았구먼.”
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정말 그녀의 오른쪽 뺨에 붙은 허연 꺼풀.
“자아, 자. 거짓말 같은 상봉 그만하고 차 마셔야지.”
정안 스님이 껄껄 웃었다.
“얼마 만이지?”
“십 년 정도.”
“난 하나도 안 늙었는데. 자넨 많이 늙었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