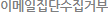돌덩어리 수좌
사진=장명확
나라를 되찾은 이듬해였다.
해인사 가야 총림에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서는 일이 없어 절구통 수좌로 불리던 효봉 스님이 조실로 계셨다.
안거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21명의 수좌들이 49일 용맹정진을 결의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잠자는 시간마저도 아껴 정진하자는 하심이었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 온몸을 던져 정진하던 수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잠을 자지 않고 정진만 한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49일째가 다가오면서 잠을 깨우기 위한 죽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제날, 21명의 수좌들이 무사히 용맹정진을 마쳤을 때 죽비를 한 대도 맞지 않은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석호(石虎), 서옹 스님이셨다. 이 날 이후 ‘돌 호랑이’라는 이름보다는 ‘돌덩어리 수좌’로 선객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서옹 스님의 이러한 정진력은 한 도반 스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보과였다.
서옹 스님은 일본 임제대에서 경학을 마치고 20년간 전국의 선방에서 수행을 하였다. 74년에 조계종 5대 종정을 역임하였으나 초발심 때에는 스님도 수행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도반 스님을 만난 것이다.
서옹 스님이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두어 해가 지나서 오대산 상원사 선방을 찾았다. 당시 상원사에는 한암 스님을 모시고 80명의 수좌들이 정진을 하고 있었다.
이 대중들 가운데 지원 스님이란 수좌가 있었다. 서옹 스님보다 세속 나이는 한 살 더 많았으나 법랍은 6년이 많은 꽤 고참 수좌였다.
이제 스물대여섯 밖에 되지 않은 지원 스님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누구를 만나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수좌였다. 그는 항상 검소하고 여법하게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역정을 부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임도 맡으려 하지 않았고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뒤켠에서 도반들의 수행을 돕는 일만 묵묵히 하였다.
상원사는 지대가 높아서 채소를 가꾸면 그 품질이 높을뿐더러 수확량도 많았다. 당시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에 따라 수좌들이 수행과 함께 밭농사를 직접 지어야만 했다. 스님들은 매일 채소밭에서 운력을 했던 것이다.
하루는 지원 스님과 서옹 스님이 무밭에서 잡초를 뽑게 되었다.
“지원 스님,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 모습을 보면 꼭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다가 매일 이렇게 운력을 하시니......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대중을 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력할 때는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서옹 스님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 대중을 위하는 일이면 환희심이 난다는 지원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서옹 스님이 허리를 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밭은 어느새 온통 푸르름 일색이었다.
“채소 농사가 잘 되니 올겨울에도 뭇국이 흔하겠습니다.”
“글쎄요. 한암 큰스님께서 워낙 검소하셔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원 스님은 한암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있는 듯 잠잠히 대답하였다.
“뭇국은 감기에도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 무를 많이......”
“지난 겨울에도 무가 많이 수확되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대중공사에서 뭇국을 끓여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무가 그렇게 흔한데도 시래기죽만 주시더군요. 물건이란 있을 때 아껴야 한다면서요.”
서옹 스님도 한암 스님의 이력을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다음날 아침 대중공양 때였다.
모처럼 참기름 병이 나오기에 대중스님들이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한암 스님은 큰 국그릇에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국을 나누어 주었다. 참기름 냄새도 맡기 어려운 정도였다.
“큰스님의 절약정신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는 것이 곧 수행이 아닌가 합니다.”
지원 스님은 한암 스님의 분신과도 같았다. 차근차근 큰스님의 뜻을 전해주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곧 한암 스님이었던 것이다.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 검소함, 이 모두가 서옹 스님에게는 마치 한암 스님과 똑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때 마침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와 밭의 마른 흙덩이를 날렸다. 순간적인 일이었으므로 지원 스님과 서옹 스님은 일어나는 그 흙먼지를 마시고 말았다.
“엣, 퇴퇴!”
서옹 스님이 침을 뱉었다.
그러나 지원스님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스님, 여기도 곧 도량입니다. 채마밭이라고 해서 침을 뱉으면 도량을 호위하는 신장들이 안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서옹 스님은 부끄러움으로 몸 둘 바를 몰랐다. 경솔한 작은 행동 하나도 자상하게 지적하여 일러주는 지원 스님이 너무도 큰 스승으로 느껴진 것은 물론이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수행인의 참모습을 본 것이다.
비로소 서옹 스님은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대답할 수 있었다.
“스님, 제가 아직 중물이 덜 든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수행자답게 정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서옹 스님은 ‘돌덩어리’ 수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용맹정진할 수 있었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근면 검약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