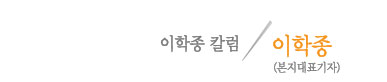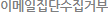솔직히 내키지는 않았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깊게는 아니지만 고민했다. 대세에 편승하기 싫으면 침묵하는 것이 본전이라도 찾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끝내 자판을 두드리고 만다. 이걸 기자의 숙명이라고 해야하나.
요즘 불교계 안팎에서 최고의 뉴스메이커로 부상한 명진 스님의 이야기를 하자니 이런저런 망상들이 지나간다.
명진 스님과의 인연은 막 불교기자를 시작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진 스님은 군사독재의 기운이 남아 있던 시절,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몇 안 되는 스님 중의 한 분이었다.
88년 여름쯤인가, 독일을 방문, 그곳의 민주인사들과 만나고 돌아온 명진 스님을 당시 근무했던 매체에 대서특필했던 기억이 있다. 또 94년 종단개혁 불사 당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효하듯 대중연설을 했던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다.
그런저런 인연으로 잘 알고 지냈던 스님이었지만, 어느 덧 세월이 흘러 큰절 주지가 되고나니 문턱이 높아진 탓인지, 차츰 소원해진 그런 이미지로 기자에겐 남아 있다.
불교계 기자들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일간지나 방송사 기자들은 잘 만나더라는 이야기를, 교계에서 고단한 삶을 살며 잔뼈가 굵은 사람들보다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나온 명망가들과 즐겨 교유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영 개운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명진 스님을 오랜만에 지난 3월 21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멀찌감치 지켜보았다. 호소력 있는 대중법문을 들으며, 역시 그 솜씨 어디 안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은근슬쩍 “명진 스님 인기가 대단하네”라고 혼잣말을 던져 신도들의 반응을 살폈다. 대뜸 뒤쪽에서 “봉은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잖아요”라며 한 젊은 여성불자가 눈물을 훔치며 답한다.
역시 듣던 대로였구나. 봉은사를 새롭게 바꾼 큰일을 해내셨구나. 그 순간 기자는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 3년을 살며 해낸 일들이, 앞서 열거한 일말의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벼이 보아선 안 될 대작불사였음을 확인했다.
한 때 흉측하게 철조망이 둘러쳐졌던 이 절이, 이제는 절에 나가는 것이 행복한 재가불자들로 가득한 도량이 된 것이다. 신도들이 주지스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절, 그런 절이 이곳 강남 한복판의 큰절 봉은사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날 기자의 눈에 띈 것은 명진 스님의 중대 발표 내용이 아니라, 스님과 신도 사이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놀라운 일체감이었다.
94년 개혁불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이뤄졌지만, 조계종 개혁은 늘 미진함을 느끼게 했던 게 사실이다. 총무원장과 본사주지를 선거로 뽑는 제도의 도입, 중앙종무기관을 3원체제로 개편한 것 등 외형적으로 조계종은 큰 변화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으나 늘 미진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의 구현에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곳 봉은사에서 그 미진한 부분이 채워지는 과정을 지난 3년간 한국불교계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다. 기자 역시 <불교평론> 등에 봉은사의 변화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본다는 내용의 기고를 했었다. “이것을 성공시켜보고자, 큰 틀에서의 개혁이 부처님법대로 간다면 종단에 파급되어 종단이 맑아지고 한국불교가 신심 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해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다”는 명진 스님의 이날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 이유다.
다 알다시피, 94년도 개혁불사의 핵심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종단과 사찰을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종법에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해 신도들을 운영 주체로 참여시키자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그것을 명진 스님은 봉은사에서 이뤄내고 있었던 것이다. 신도들이 봉은사 신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명진 스님의 말씀처럼 이런 흐름이 봉은사를 기점으로 모든 사찰로 번져 간다면 불교중흥이 결코 꿈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봉은사 사부대중이 일군 그 소중한 가치가 법정스님이 입적하던 날, 중앙종회에서 봉은사가 직영사찰로 전격 지정되면서 장탄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기자는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지난 3년간 쌓아올린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동시에 몰려왔다.
총무원이나 중앙종회, 원로회의 주장처럼 직영사찰 지정의 이유와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에, 그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직영사찰 지정이 적법했으니 종도로서 따라야 한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한다고 치자. 또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도시포교와 불교중흥에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치자.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웃음과 자부심을 잃고, 불자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25만 봉은사 신도들의 상실감은 어찌할 것인가. 사찰의 진정한 주인인 신도들이 입은 실망과 좌절감은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가. 그들이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혹시 이번에도 과거처럼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믿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은사의 사부대중들이 지난 3년간 일궈놓은 성과들, 즉 가장 이상적인 사찰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팽개쳐도 괜찮은 것인가.
총무원이 짜놓은 도시포교 활성화 계획보다도, 중앙종회의 표결에 의한 직영전환 결정보다도, 일부 원로들의 전례 없는 종법 준수 촉구보다도 더 값진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째서 지금 이 순간, 종법을 따르라고 외치는 메마른 목소리만 들리고, 원숙하지 못한 종무행정으로 지난 3년간 봉은사 사부대중이 일궈놓은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꾸짖는 눈밝은 어른은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