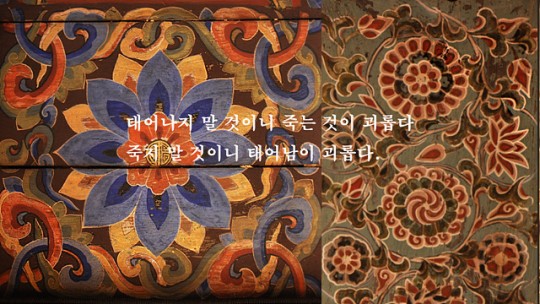> 정진원 교수의 노래하는 삼국유사
사복의 어머니, 아들과 함께 간 연화장 세계
정 진원 2024-12-12 (목) 09:02
정진원(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K Classic 콘텐츠연구소 소장)
원효와 사복의 관계
사복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예수의 어머니처럼 아버지 없이 사복을 낳았다고 한다. 게다가 그렇게 루머와 질시를 무릅쓰고 낳은 아들은 12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사복, 곧 뱀복이, 뱀동이, 뱀돌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인 일인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멀쩡해져 고선사에 있는 원효를 찾아가 함께 장례를 치르자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전생에 사복과 원효의 불경을 실었던 암소라는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는 사복의 당당한 태도를 주목하여 ‘금강삼매경론’의 차례를 꿰어 맞추던 원효의 스승 ‘대안대사’의 후신이라는 이야기, 원효가 그 차례 맞춘 금강삼매경의 논소를 소 타고 지었다던 이야기에서 그때의 소가 사복 어머니의 전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사복의 당당한 태도와 말투는 거의 동료나 원효의 윗사람 이상이다. 찾아온 사복에게 예를 갖추니 사복은 답배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동국이상국집’의 이규보가 말하기를 부안 내소사에 원효의 진영이 모셔져 있고 원효방 옆에 사복성인의 암자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는 원효를 시봉하며 차를 달여 공양했다고 하니 사복이 후배로 여겨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쨌든 사복과 그의 어머니는 미스터리한 인물들이다. 사복은 한 번 더 삼국유사에 기록을 남기는데 흥륜사 금당 십성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신라 십대 성인의 반열에 드는 것은 물론 그것도 원효 앞자리의 서열이다.
뱀처럼 기어 뱀복이, 뱀보와 그의 어머니
거의 늘 삼국유사에서 보아 왔듯이 사복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다.
어떻게 과부의 몸으로 남자 없이 사복을 임신을 했단 말인가. 그렇게 낳은 자식이 뱀처럼 배밀이를 하며 지내는 12년 동안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을 것이다. 비범하게 태어나 평범한 것도 마음 아플 터에 지체장애로 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말문이 트이고 원효와 맞상대하는 비범한 인간으로 변모할 때까지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간의 사정은 당연히 이하 생략이다.
내가 가르친 늦깎이 학생 중에 지적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눈물겨운 노력으로 그가 그나마 좋아하는 악기를 가르쳐 대학에 입학시킨 어머니가 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악기를 배웠으며 아들을 가르쳤으며 그렇게 애쓴 보람을 다른 장애 아동들에게 나누어주다 이제는 뮤지컬감독을 꿈꾸는 만학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동은 함께 강의 듣던 대학 1학년 학생들이 MVP 발표자로 꼽을 만큼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세간에서는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엄마는 힘이 세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사복의 어머니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남들이 과부가 지아비 없이 낳은 자식에 대하여, 또 벙어리에 뱀보라고 놀렸을지라도 그녀에게는 하늘이 내린 둘도 없는 유일한 보람이자 의지처였을 것이다. 21세기 살아도 녹록지 않았을 그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 끊임없이 정성을 쏟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사복모자의 12년 긴 세월에 대하여 역사학자 김상현교수는 12연기에 비견하기도 한다. ‘무명(無明)에서 생(生)·노사(老死)’로 이어지는 번뇌와 고(苦)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흔히 인생을 고해(苦海)에 비유하고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제(苦諦)이니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사복의 본래 진면목이 드러난 후 그 어머니는 홀가분하게 피안의 길을 떠났을 것이고 그 아들은 그러한 어머니를 위하여 원효에게 포살(布薩) 의식을 부탁한다. 포살이란 참회 수행을 통해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것이니 살아생전의 참회를 통해 열반에 이르게 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때 원효가 축원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삽화 디자인=미디어붓다)
어머니를 위한 원효와 사복의 노래
태어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롭고
죽지 말 것이니 태어남이 괴롭도다.
莫生兮 其死也苦 莫死兮 其生也苦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는 괴로움(苦)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때 말을 아끼다 못해 12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던 사복의 한 마디! ‘말이 번거롭소.’
원효는 다시 고쳤다.
죽고 사는 것이 괴롭도다.
死生苦兮
그리고는 둘이 장사 지내러 가며 원효가 하는 말.
‘지혜의 호랑이를 지혜의 숲에 장사 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오’
사복의 어머니는 지혜의 호랑이였던 것이다. 그에 대한 그 아들 사복의 답가는 이러하였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세계로 들어가려 하네.
往昔釋迦牟尼佛 裟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 欲入蓮花藏界寬
사복의 어머니가 부처와 같이 되는 순간이다. 원효는 7세기 당시 왕족, 귀족 중심의 불교였던 신라에서 대중에게 부처와 염불을 알려 주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민중불교의 창시자로 칭송되었다. 원효의 이러한 교화와 실천 수행으로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신라 민초 부처는 어쩌면 사복의 어머니일지 모른다.
그 말을 마친 사복의 장례식도 멋지다. 어머니를 업고 풀포기를 뽑으니 ‘열려라 참깨!’ 하는 것처럼 땅이 열리고 칠보로 장식한 연화장세계가 열렸다는 것이다. 그 세계로 모자가 함께 들어가자 땅은 다시 합쳐지고 원효는 아무 일 없던 듯 고선사로 돌아왔다. 그 고선사의 삼층석탑은 지금은 덕동댐으로 수몰된 고선사에 남아 있지 않고 경주 박물관 앞에 국보로 서있다.
고선사 터 삼층석탑
후세 사람들이 그러한 사복을 기려 도량사를 짓고 해마다 3월 14일에 점찰법회를 열었다 하니 그가 어머니와 함께 연화장 세계로 들어간 날일 것이다. 이 도량사터도 설은 분분하나 대략 백률사가 있는 금강산 동남쪽 마애불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도량사 터
일연스님의 노래
일연스님은 이렇게 사복의 이야기를 맺었다.
연못 속 묵묵히 잠자는 용 어이 평범하리
떠나면서 읊은 곡조 복잡할 것 없도다
괴로운 생사도 원래 괴로움 아니네
연화장에 떠다니니 세계가 넓구나.
淵黙龍眠豈等閑 臨行一曲沒多般 苦兮生死元非苦 華藏浮休世界寬
홀어머니의 위대함
사복의 어머니도 과부였고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의 어머니도 과부였는데 잠룡과 관계하여 서동을 낳았다는 스토리에서 뭔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설총의 엄마 요석공주도 과부였던 차에 원효와의 사랑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도 과부나 다름없이 지내는 것은 무애행을 펼치는 원효불기 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의 어머니 고도령도 혼자였고 의상의 출중한 제자 진정국사의 어머니도 과부여서 진정이 출가를 망설였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의 어머니도 아흔이 넘도록 홀로 아들 해바라기를 하여 여든 다 된 아들이 국사 지위를 사양하고 군위로 내려오지 않던가.
어림잡아도 줄줄이 이어지는 아버지 부재의 모자 스토리는 일연의 동병상련으로 이어지는 삼국유사 속 홀어머니 퍼레이드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자의 양육법처럼 아버지 그늘이 없어야 사나이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펼치는 것일까. 어느 정도의 결핍은 인간을 내면으로 성숙시키고 근본적인 철학을 하게 하는 것일까. 이즈음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결핍이 적은 환경에서 자라난 일부 젊은이들이 작은 역경에도 쉽게 스러져 가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복과 그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평범치 않은 세간살이와 함께 도달한 출세간 연화장세계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