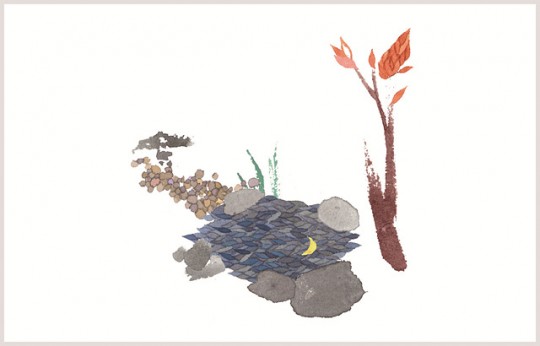>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공감언어와 법문
법정스님 공감법어72
정찬주 2019-10-30 (수) 08:34
일러스트 정윤경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스님의 말씀과 침묵
#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부처로 떠받들려고 하기 때문에 스치고 맙니다. 부처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 있는 참 부처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부처로 떠받들려고 하기 때문에 스치고 맙니다. 부처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 있는 참 부처를 놓치게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부처님이 살아 계실 당시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박카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카리가 중병이 들어 나을 기약 없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처님을 꼭 한 번 뵙고 하직인사를 드리는 것이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간호해 주던 스님에게 부탁해서,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뵙게 해달라고 청을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이 앓고 있는 박카리를 찾아갑니다. 이때 박카리가 부처님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죽기 전 부처님을 꼭 한 번 뵙고 하직인사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이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아야 하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아야 한다. 진정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라.”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이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아야 하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아야 한다. 진정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진리, 혹은 도리입니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 세상의 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어느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타 석가모니는 육신의 나이 여든이 되어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법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어느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타 석가모니는 육신의 나이 여든이 되어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성내고, 화내고, 삐뚤어진 자기가 아니라 본래적인 청정한 자기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설령 부처님 자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입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본래적인 자기와 진리, 이것뿐입니다. 자신과 진리를 제쳐두고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에 선 것에 불과합니다.
갈무리 생각
지난 10월 12일 인도에서 돌아왔다. 인도는 30도 이상의 날씨인데 국내는 벼 수확이 끝나가고 가을 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단풍들어가는 산빛은 햇살이 깊게 스며들어 투명했고. 부처님께서 진리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해서 정진하라고 유언하신 쿠시나가라에서 하룻밤 묵었다. 바이샬리에 계시던 부처님이 쿠시나가라로 가서 열반하신 까닭은 그곳이 전생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귀소본능이 있었을까 싶다. 우리 일행은 석양 무렵에 도착해서 한 번, 하룻밤 묵은 뒤 안개 짙은 아침에 또 한 번, 두 번이나 열반당에 앉아서 좌선했다. 그 선정의 순간이 참으로 곡진하고 행복했던 것 같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돌아가신 선친 49재 중에 2재를 마친 뒤 나는 나머지 재를 동생에게 맡기고 나서 홀연히 내 산방을 떠난 일이 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로 향했던 것이다. 선친께서 극락왕생하셨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였다. 나머지 재를 지낸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나를 인도로 떠밀었다. 선친께서 운명하시던 새벽에 나는 선친의 팔다리를 주물러드렸는데 선친은 아주 편안하게 먼 길을 떠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선친께서 극락왕생하셨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나는 쿠시나가라로 와서 부처님 열반상을 참배한 뒤 깊은 상념에 잠겼다. 내 나름의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았다.
지난 10월 12일 인도에서 돌아왔다. 인도는 30도 이상의 날씨인데 국내는 벼 수확이 끝나가고 가을 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단풍들어가는 산빛은 햇살이 깊게 스며들어 투명했고. 부처님께서 진리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해서 정진하라고 유언하신 쿠시나가라에서 하룻밤 묵었다. 바이샬리에 계시던 부처님이 쿠시나가라로 가서 열반하신 까닭은 그곳이 전생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귀소본능이 있었을까 싶다. 우리 일행은 석양 무렵에 도착해서 한 번, 하룻밤 묵은 뒤 안개 짙은 아침에 또 한 번, 두 번이나 열반당에 앉아서 좌선했다. 그 선정의 순간이 참으로 곡진하고 행복했던 것 같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돌아가신 선친 49재 중에 2재를 마친 뒤 나는 나머지 재를 동생에게 맡기고 나서 홀연히 내 산방을 떠난 일이 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로 향했던 것이다. 선친께서 극락왕생하셨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였다. 나머지 재를 지낸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나를 인도로 떠밀었다. 선친께서 운명하시던 새벽에 나는 선친의 팔다리를 주물러드렸는데 선친은 아주 편안하게 먼 길을 떠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선친께서 극락왕생하셨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나는 쿠시나가라로 와서 부처님 열반상을 참배한 뒤 깊은 상념에 잠겼다. 내 나름의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았다.
“미소 짓는 저 자비로운 얼굴과 가지런한 맨발에 부처님의 팔십 평생이 다 담겨 있구나!”
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