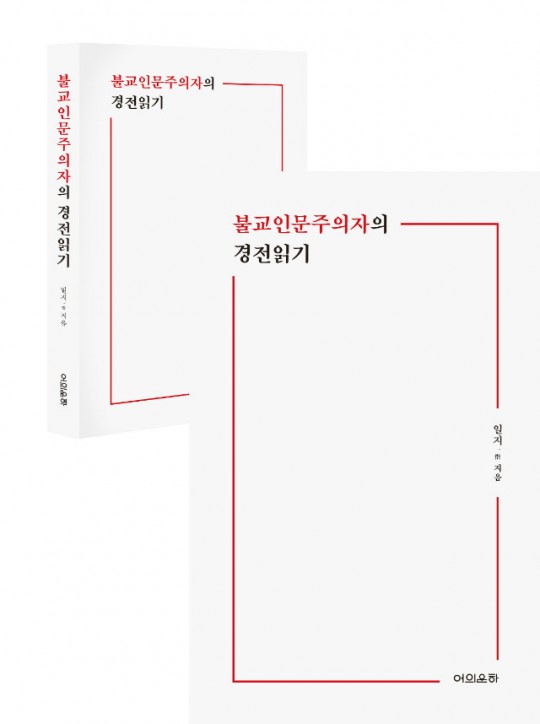출판
일지 스님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읽기』 출간
염정우 기자 bind1206@naver.com 2018-12-28 (금) 11:29
‘불교인문학주의’를 개척한 일지 스님이 세수44세의 젊은 나이로 입적하기 전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간 월간 <불광>에 연재한 글을 모아 도서출판 ‘어의운하’에서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읽기』로 세상에 내놓았다.
일지 스님은 15세 때인 1974년에 출가, 해인강원과 율원을 수료했다. 1988년 논문 ‘현대중공의 불교인식’으로 제1회 해인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후 그는 불교적 삶과 현대사회의 관계성이 깊이 천착하면서 특유의 박람강기와 직관적 문체를 바탕으로 경전과 선을 탐구해나갔다.
일지 스님이 열네 살에 집을 나와 간 곳이 해남 대흥사 진불암이었다. 이 진불암의 생활을 『선불교 백문백답』 서문(1997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전의 어느 가을, 감옥 같던 집과 학교를 모두 거부한 더벅머리 소년으로 해남 대흥사 진불암의 뜰을 쓸고 있었다. …그때 가진 것은 없어도 그 무엇의 노예도 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와 무욕의 평화를 최대한 체험했던 것이다. ... 이 책은 그때 이미 누더기를 걸치고 저 상공포구의 선착장에 파리한 얼굴로 서 있던 한 소년의 가슴 속에서 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지스님은 1980년 해인강원을 졸업하고, 1982년 해인율원을 수료했는데, 이 시기에 한국 현대불교의 큰 스승인 성철스님과 조우한다. 이 후 한글세대에게 성철스님을 소개하는 책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을 탈고 한다. 일지스님이 한글세대용으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서술한 책이지만, 그의 간결하고 힘찬 필력으로 성철을 더 깊이 알고자하는 모두가 읽어도 모자람이 없는 저서다.
일지스님은 해인사를 나온 이후 경전과 선을 탐구해나갔다. 그의 경전과 선의 편력은 초기불교에서 아비달마, 부파, 대승, 중관, 유식, 선 등을 종횡무진하며 나아간다. 그에게 경전과 선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닌, “다가오는 21세기는 불교에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깊이 배어 있다. 예컨대 그는 “선은 역사 형성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선의 성찰적 근대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불교가 “인문학적으로 광범위하게 검토”될 것을 주문한다. 그의 이런 탐구정신은 ‘불교인문주의’라는 그만의 사상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20여 권의 저작물들은 이런 물음을 던진 것에 대한 그만의 답변인 셈이다.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읽기』는 불교인뿐 아니라 불교를 이해하는 이들이 삶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24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주제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폈다. 경전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과 삶, 그리고 사회와 역사와 문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출가 이후 ‘경전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실천해야 하는가?’란 문제의식과 연결되며, 그 물음은 ‘불교의 인문적 해석과 실천’이라는 저자의 통찰과 맞닿아있다. 특히 저자가 맨 처음 올린 <붓다>의 해석은 불교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는지, 통찰력있게 보여준다.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증일아함경』 권28, 「청법품」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증일아함경』 권28, 「청법품」
“부처님은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한다. 불교는 신神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 불교도에 있어 종교의 의미는 타율적인 심판을 내리는 절대자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삶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차적인 신앙과 수행의 체계라는 점이다. 불교도들에게 있어 신앙의 의미는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지혜’의 증장에 필요한 덕목이며 마음의 청정을 증득하는 기본 전제이다.”(11쪽)
또한 <불교에서 길을 묻다>란 주제에서 스님은 “젊은이들이 항상 묻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핵심에는 몸가짐과 마음닦음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다”(19쪽)라며 불교의 본질을 명료하게 짚어낸다.
<선>의 항목에서는 현대 한국선의 문제를 ‘위기의 선’으로 진단하며, 선이 마치 인스턴트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계한다.
“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승불교 본래의 지혜와 자비를 망각한 선은 불교가 아니라 도교다. 한국불교의 승가가 진정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계속 선이라고 한다면 선의 실참과 불교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79쪽)
“대승불교의 강인한 인간주의에서 출발한 선의 ‘내심자증內心自證 자각성지自覺聖智’라는 대주제가 일상의 실천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선은 동양사상의 아류로 전락한 채 ‘깨달음’이라는 허망한 독백만을 일삼게 될 것이다.”(83쪽)
“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승불교 본래의 지혜와 자비를 망각한 선은 불교가 아니라 도교다. 한국불교의 승가가 진정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계속 선이라고 한다면 선의 실참과 불교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79쪽)
“대승불교의 강인한 인간주의에서 출발한 선의 ‘내심자증內心自證 자각성지自覺聖智’라는 대주제가 일상의 실천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선은 동양사상의 아류로 전락한 채 ‘깨달음’이라는 허망한 독백만을 일삼게 될 것이다.”(83쪽)
<해탈>에서는 해탈의 신비성과 추상성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해탈은 그렇게 신비적이거나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만 가지 멍에에 묶여있는 현대인이야말로 해탈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상태, 욕구에 대해 사색하고 탐진치貪瞋癡로 오염되어 있는 불순한 에너지와 거품을 걷어내면 해탈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신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99쪽)
“해탈은 그렇게 신비적이거나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만 가지 멍에에 묶여있는 현대인이야말로 해탈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상태, 욕구에 대해 사색하고 탐진치貪瞋癡로 오염되어 있는 불순한 에너지와 거품을 걷어내면 해탈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신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99쪽)
<보리심>에서는 보리심이야말로 불교의 정신이 꽃피는 대승보살의 수행임을 강조한다.
“젊은 날 세웠던 수없는 결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뎌져가더라도 역시 이 결심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자각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욕망과 이기심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과 이기심의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강렬하게 희구한다. 그 결심이 서는 자리에서 바로 불교는 시작된다.”
“젊은 날 세웠던 수없는 결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뎌져가더라도 역시 이 결심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자각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욕망과 이기심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과 이기심의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강렬하게 희구한다. 그 결심이 서는 자리에서 바로 불교는 시작된다.”
<보살>에서는 보살이 대승불교의 실천자임을 말한다.
“불교의 실천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말만 실천을 앞세울 뿐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실천도 일회적인 캠페인에 불과하다. 불교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밝은 사회를 염원하는 인류의 사라지지 않는 꿈이며, 동양의 종교와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종교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살의 눈, 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181쪽)
“불교의 실천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말만 실천을 앞세울 뿐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실천도 일회적인 캠페인에 불과하다. 불교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밝은 사회를 염원하는 인류의 사라지지 않는 꿈이며, 동양의 종교와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종교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살의 눈, 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181쪽)
<정토>에서는 어디에서 정토신앙이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토신앙의 본질은 구원이다. 정토신앙은 예토穢土의 오염을 반성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인정한다.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비와 본원本願에 귀의하여 정토를 희구한다. 정토신앙은 나약한 인간이 절대자의 힘을 빌리는 연약한 신앙일까. 아니다. 숙업의 올가미에 묶여 있는 연약한 인간,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어두운 나락을 깊이 응시하여 스스로의 죄업을 참회하고 탐욕과 무지, 항상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 유한한 예토에서 정토를 구현하려는 신앙이다. 인간 스스로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진솔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야말로 정토신앙의 출발점이다.”
“정토신앙의 본질은 구원이다. 정토신앙은 예토穢土의 오염을 반성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인정한다.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비와 본원本願에 귀의하여 정토를 희구한다. 정토신앙은 나약한 인간이 절대자의 힘을 빌리는 연약한 신앙일까. 아니다. 숙업의 올가미에 묶여 있는 연약한 인간,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어두운 나락을 깊이 응시하여 스스로의 죄업을 참회하고 탐욕과 무지, 항상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 유한한 예토에서 정토를 구현하려는 신앙이다. 인간 스스로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진솔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야말로 정토신앙의 출발점이다.”
일지 스님 ∥ 어의운하
127*197mm ∥ 252쪽
13,000원
127*197mm ∥ 252쪽
13,000원
일지一指스님은
1960년에 태어나, 1974년에 출가하여1980년 해인사 강원(제21회)을 졸업하고 1982년 해인율원을 수료했다. 이후 계속 경학經學과 선학禪學에 정진해 왔으며, 문경 봉암사, 망월사, 오대산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했다. 1988년에 논문 「現代中共의 佛敎認識」으로 제1회 해인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낙산사 교무를 거쳐 사단법인 법사원불교대학 교수, 불지사 출판부장, 민족사 주간으로 일하면서 경전과 선어록과 인문학의 경계를 해석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유의 박람강기와 직관적인 문체로 불교적 삶과 현대사회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온 그는 ‘불교인문주의’라는 독특한 영역을 심화시켜 많은 불교 관련 저서를 쓰고 경전과 선어록들을 번역했다. 1997년부터는 불교경학연구소를 설립,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강의했다. 2002년 여름 43세에 서울 수국사 내 10평 정도의 컨테이너 방에서 홀로 세상 밖으로 떠났다. 저서로는 『달마에서 임제까지』(1991), 『붓다·해석·실천』(1991),『중관불교와 유식불교』(1992), 『떠도는 돈황―불교문학과 선으로 본 오늘의 불교인문주의』(1993),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1994), 『禪學辭典(共編)』(1995),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1996), 『선禪이야기』(1996), 『佛名辭典』(1997), 『선불교강좌 백문백답』(1997), 『불교교리(共著)』(1998),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共著)』(1998) 등이 있고, 역서로는 『임제록』(1988), 『까르마의 열쇠』(1990), 『禪을 찾는 늑대』(1991), 『중국문학과 禪』(1992), 『傳心法要』(1993), 『범망경·지장경』(1994), 『관음경·부모은중경』(1994), 『통윤의 유마경 풀이』(1999) 등이 있다.
목차궁극의 화두인 붓다 006
불교에서 길을 묻다 016
업業 026
인간人間 036
신앙信仰 046
병과 건강 056
경전經典 066
선禪 076
연기緣起 086
해탈解脫 096
무아無我 106
무량수경이 설하는 다섯 가지 대악大惡 116회심回心 126
보리심菩提心 136
인욕忍辱 146
제법실상諸法實相 156
정진精進 166
보살菩薩 176
전법傳法 186
신구의 삼업三業 196
몸 206
마음의 평화 216
아소카의 법 226
정토淨土 236
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