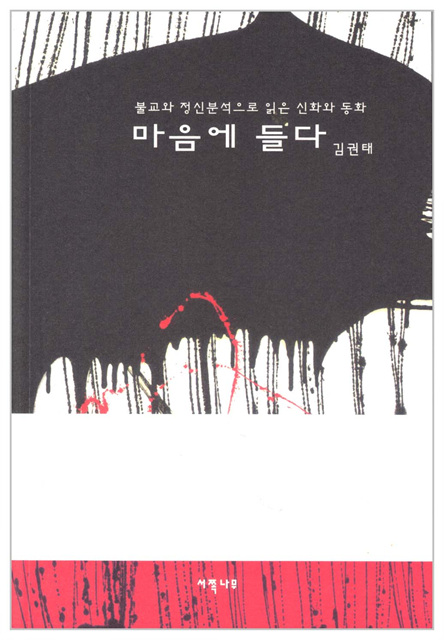출판
김권태 작가, 『마음에 들다』 출간
미디어붓다 mediabuddha@hanmail.net 2018-10-25 (목) 18:04
오랫동안 ‘언어의 극단’과 ‘인식의 극단’을 탐색해 김권태 작가가 불교와 정신분석을 통섭하며 신화와 동화를 분석한 책 『마음에 들다 - 불교와 정신분석으로 읽은 신화와 동화』를 도서출판 서쪽나무와 함께 내놓았다. 신화와 동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달과정과 희로애락을 담고 있으며, 우리 마음을 선명하게 되비춰주는 이야기 거울이기도 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환호하는 시기는 자아의 발달에 있어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는 나라는 동일성과 타자라는 차이성을 통해 분화되며 감각된다. 이는 아이가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이는 어떤 사물의 지칭과 명명인 ‘명사’에서 출발해 차츰 사물의 고유한 속성인 ‘동사’를 습득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습득한다. 그리고 ‘나-너-그’의 인칭변화를 감각하며, ‘명사·동사·형용사·부사’가 그려내는 세계에 ‘나’라는 동일성과 ‘타자’라는 차이성을 부여한다. ‘언어’는 곧 감각경험의 세계를 의미의 상징세계로 전환하는 마술이며, 이때 ‘자아’는 유일무이한 고유성을 얻는 동시에 인다라망(因陀羅網) 같은 상징세계로 들어와 타자와도 연결된다. 나의 고유한 욕망들이 실은 타자의 욕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징의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p23)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환호하는 시기는 자아의 발달에 있어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는 나라는 동일성과 타자라는 차이성을 통해 분화되며 감각된다. 이는 아이가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이는 어떤 사물의 지칭과 명명인 ‘명사’에서 출발해 차츰 사물의 고유한 속성인 ‘동사’를 습득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습득한다. 그리고 ‘나-너-그’의 인칭변화를 감각하며, ‘명사·동사·형용사·부사’가 그려내는 세계에 ‘나’라는 동일성과 ‘타자’라는 차이성을 부여한다. ‘언어’는 곧 감각경험의 세계를 의미의 상징세계로 전환하는 마술이며, 이때 ‘자아’는 유일무이한 고유성을 얻는 동시에 인다라망(因陀羅網) 같은 상징세계로 들어와 타자와도 연결된다. 나의 고유한 욕망들이 실은 타자의 욕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징의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p23)
저자는 이 책에서 방대한 교리체계의 불교와 체험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정신분석의 핵심을 친근하고도 널리 알려진 ‘신화(나르키소스·오이디푸스·에로스와 프시케)’와 ‘동화(신데렐라·잭과 콩나무·백설공주)’를 통해 대중들의 언어로 쉽게 풀이하고 있다.
동화는 영웅신화와 마찬가지로 ‘분리→고난→귀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던 주인공에게 갑작스런 시련과 과업이 주어지고, 주인공은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서 한층 성숙한 인물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것은 ‘의존과 독립’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마음주제이며, 관혼상제로 대변되는 인간의 ‘보편적 통과의례’에 관한 이야기다. 이때의 해피엔딩은 고난의 극복을 통해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숙을 위한 과정이고 그 뒤에 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p104)
동화는 영웅신화와 마찬가지로 ‘분리→고난→귀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던 주인공에게 갑작스런 시련과 과업이 주어지고, 주인공은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서 한층 성숙한 인물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것은 ‘의존과 독립’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마음주제이며, 관혼상제로 대변되는 인간의 ‘보편적 통과의례’에 관한 이야기다. 이때의 해피엔딩은 고난의 극복을 통해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숙을 위한 과정이고 그 뒤에 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p104)
또 본문 외에 따로 주석을 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표층구조(본문)와 심층구조(주석)로 차원을 달리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본문과 주석이 합해져 이야기 저변에 숨어있던 진실과 함께 새로운 맥락의 텍스트를 만들었다.
‘불교와 정신분석과 신화와 동화’는 이렇게 처음 한 자리에서 만나, 인간 정신의 장엄하고도 높은 새로운 사원(寺院)이 되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닿지 못할 그 깊은 심연에 대해, 그대가 “왜?”라는 질문을 품고 있다면, 이 책은 그대의 질문과 함께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무상한 것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착각과 집착을 갖는데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괴로움인 것이다.(p108)
‘불교와 정신분석과 신화와 동화’는 이렇게 처음 한 자리에서 만나, 인간 정신의 장엄하고도 높은 새로운 사원(寺院)이 되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닿지 못할 그 깊은 심연에 대해, 그대가 “왜?”라는 질문을 품고 있다면, 이 책은 그대의 질문과 함께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무상한 것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착각과 집착을 갖는데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괴로움인 것이다.(p108)
저자 김권태 ∥ 서쪽나무
140쪽 ∥12,000원
140쪽 ∥12,000원
저자약력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한문학을 전공하였고,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였다. 2003년 계간 『시와반시』로 등단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산문집 『빛이 되는 산책』, 고전번역서 『노자독법』 『노자시집』, 철학에세이 『행복성찰』, 시집 『빛의 속눈썹』, 불교와 정신분석 에세이 『나라는 증상, 삶이라는 환상』 등이 있다.
들어가는 말2017년 한 해 동안 『법보신문』에 연재한 글들을 묶는다. 불교와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신화와 동화를 분석한 칼럼이다. 지면 관계상 칼럼에 미처 옮기지 못했던 내용들은 새로 각주를 들여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실천론’은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범주화하는 네 가지 큰 질문이자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죽음 이후의 일들을 다루는 것은 ‘종교’이고, 인간의 마음과 마음 이면을 살펴보는 일은 ‘정신분석’이다. 따라서 종교는 멀리서 인간을 내다보는 망원경이라 할 수 있고, 정신분석은 가까이서 인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는 신이 아닌 각각의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마음을 주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하고 정밀한 대서사시를 남겼다. 심연을 탐색하는 수단으로 불교를 선택한 이유이다.
또 ‘이야기’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이 투사되어 나오는 하나의 프리즘이다.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빛 욕망과 그 경계에 숨어 일렁이는 수많은 무의식적 욕망들이 마음의 화엄을 이룬다. 프리즘 양 단에는 흰 빛과 검은 빛이 서로를 마주보며 욕망의 바탕이 된다. 이때 흰 빛은 세상을 낙관하며 전망하는 ‘동화’의 세계라 할 수 있고, 검은 빛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신화’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심연을 이야기와 종교, 정신분석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에 관한 보편적이고 시원적인 ‘세 개의 신화(나르키소스·오이디푸스·에로스와 프시케)’와 ‘세 개의 동화(신데렐라·잭과 콩나무·백설공주)’를 ‘불교’와 ‘정신분석’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것을 전망하고 최대의 것으로 최소의 것을 분석하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만나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꿈이 있다. 꿈속에서 거울을 보았는데 날카로운 눈매로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꿈밖의 나’와 ‘꿈속의 나’와 ‘꿈속 거울 속의 나’를 두고, 감각되는 이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이 보이는 세계라는 것이 꿈속의 환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꿈속 거울에 비친 환영의 환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마치 종이 안에 난 커다란 구멍을 두고, 이것을 종이의 것이라고 해야 할지 허공의 것이라고 해야 할지를 묻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이 모든 질문을 만드는 자이며, 이 모든 경험을 응시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있다.
스스로 치열한 물음을 통해, 이 세계의 진실에 닿는 성긴 징검다리를 내어보았다. 독자제현의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부 사성제의 진리도식
1. 가끔씩 상담현장에서
2. 어느 공장에서
제2부 인간의 심연을 엿보는 세 개의 신화
성장을 이끄는 위대한 질문
1. 나르키소스
2. 오이디푸스
3. 에로스와 프시케
제3부 인간의 심연을 엿보는 세 개의 동화
1. 신데렐라
2. 잭과 콩나무
3. 백설공주
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Comments